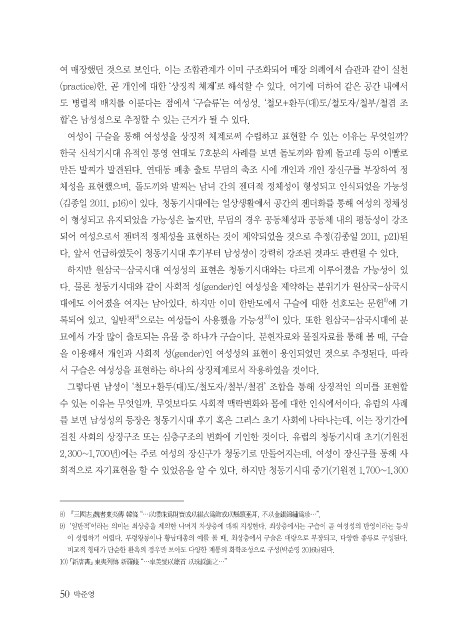Page 52 - 오산학 연구 6집
P. 52
여 매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합관계가 이미 구조화되어 매장 의례에서 습관과 같이 실천
(practice)한, 곧 개인에 대한 ‘상징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공간 내에서
도 병렬적 배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구슬류’는 여성성, ‘철모+환두(대)도/철도자/철부/철겸 조
합’은 남성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성이 구슬을 통해 여성성을 상징적 체계로써 수립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신석기시대 유적인 통영 연대도 7호분의 사례를 보면 돌도끼와 함께 돌고래 등의 이빨로
만든 발찌가 발견된다. 연대동 패총 출토 무덤의 축조 시에 개인과 개인 장신구를 부장하여 정
체성을 표현했으며, 돌도끼와 발찌는 남녀 간의 젠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인식되었을 가능성
(김종일 2011, p16)이 있다. 청동기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공간의 젠더화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
이 형성되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무덤의 경우 공동체성과 공동체 내의 평등성이 강조
되어 여성으로서 젠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제약되었을 것으로 추정(김종일 2011, p21)된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남성성이 강력히 강조된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하지만 원삼국-삼국시대 여성성의 표현은 청동기시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다. 물론 청동기시대와 같이 사회적 성(gender)인 여성성을 제약하는 분위기가 원삼국-삼국시
8)
대에도 이어졌을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에서 구슬에 대한 선호도는 문헌 에 기
9)
10)
록되어 있고, 일반적 으로는 여성들이 사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원삼국-삼국시대에 분
묘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 중 하나가 구슬이다.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를 통해 볼 때, 구슬
을 이용해서 개인과 사회적 성(gender)인 여성성의 표현이 용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구슬은 여성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성이 ‘철모+환두(대)도/철도자/철부/철겸’ 조합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적 맥락변화와 몸에 대한 인식에서이다. 유럽의 사례
를 보면 남성성의 등장은 청동기시대 후기 혹은 그리스 초기 사회에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의 상징구조 또는 심층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유럽의 청동기시대 초기(기원전
2,300~1,700년)에는 주로 여성의 장신구가 청동기로 만들어지는데, 여성이 장신구를 통해 사
회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중기(기원전 1,700~1,300
8) 『三國志』魏書東夷傳 韓條 “…以瓔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9)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차상층에 대해 지칭한다. 최상층에서는 구슬이 곧 여성성의 반영이라는 등식
이 성립하기 어렵다. 무령왕릉이나 황남대총의 예를 볼 때, 최상층에서 구슬은 대량으로 부장되고,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다.
비교적 형태가 단순한 환옥의 경우만 보아도 다양한 계통의 화학조성으로 구성(박준영 2016b)된다.
10)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條 “…率美髮以繚首 以珠綵飾之…”
50 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