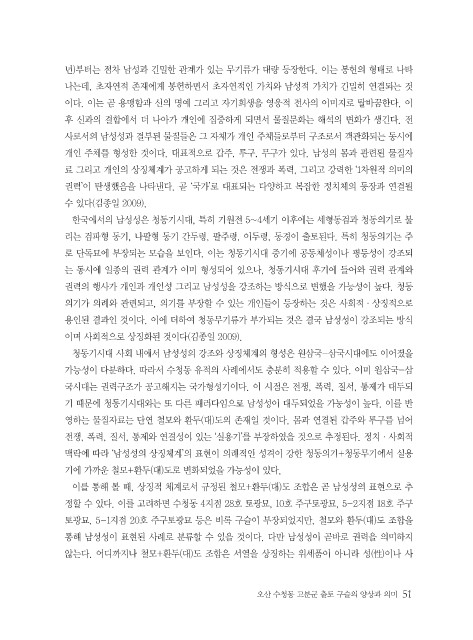Page 53 - 오산학 연구 6집
P. 53
년)부터는 점차 남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무기류가 대량 등장한다. 이는 봉헌의 형태로 나타
나는데, 초자연적 존재에게 봉헌하면서 초자연적인 가치와 남성적 가치가 긴밀히 연결되는 것
이다. 이는 곧 용맹함과 신의 명예 그리고 자기희생을 영웅적 전사의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이
후 신과의 결합에서 더 나아가 개인에 집중하게 되면서 물질문화는 해석의 변화가 생긴다. 전
사로서의 남성성과 결부된 물질들은 그 자체가 개인 주체들로부터 구조로서 객관화되는 동시에
개인 주체를 형성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갑주, 투구, 무구가 있다. 남성의 몸과 관련된 물질자
료 그리고 개인의 상징체계가 공고하게 되는 것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강력한 ‘1차원적 의미의
권력’이 탄생했음을 나타낸다. 곧 ‘국가’로 대표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체의 등장과 연결될
수 있다(김종일 2009).
한국에서의 남성성은 청동기시대, 특히 기원전 5~4세기 이후에는 세형동검과 청동의기로 불
리는 검파형 동기, 나팔형 동기 간두령, 팔주령, 이두령, 동경이 출토된다. 특히 청동의기는 주
로 단독묘에 부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공동체성이나 평등성이 강조되
는 동시에 일종의 권력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와 권력 관계와
권력의 행사가 개인과 개인성 그리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
의기가 의례와 관련되고, 의기를 부장할 수 있는 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상징적으로
용인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동무기류가 부가되는 것은 결국 남성성이 강조되는 방식
이며 사회적으로 상징화된 것이다(김종일 2009).
청동기시대 사회 내에서 남성성의 강조와 상징체계의 형성은 원삼국-삼국시대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수청동 유적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원삼국-삼
국시대는 권력구조가 공고해지는 국가형성기이다. 이 시점은 전쟁, 폭력, 질서, 통제가 대두되
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와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남성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
영하는 물질자료는 단연 철모와 환두(대)도의 존재일 것이다. 몸과 연결된 갑주와 투구를 넘어
전쟁, 폭력, 질서, 통제와 연결성이 있는 ‘실용기’를 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남성성의 상징체계’의 표현이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청동의기+청동무기에서 실용
기에 가까운 철모+환두(대)도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징적 체계로서 규정된 철모+환두(대)도 조합은 곧 남성성의 표현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수청동 4지점 28호 토광묘, 10호 주구토광묘, 5-2지점 18호 주구
토광묘, 5-1지점 20호 주구토광묘 등은 비록 구슬이 부장되었지만, 철모와 환두(대)도 조합을
통해 남성성이 표현된 사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성성이 곧바로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철모+환두(대)도 조합은 서열을 상징하는 위세품이 아니라 성(性)이나 사
오산 수청동 고분군 출토 구슬의 양상과 의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