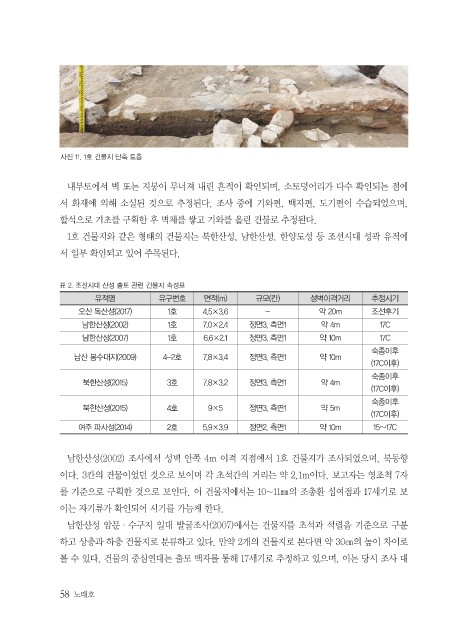Page 60 - 오산학 연구 4집
P. 60
사진 11. 1호 건물지 단축 토층
내부토에서 벽 또는 지붕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확인되며, 소토덩어리가 다수 확인되는 점에
서 화재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중에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이 수습되었으며,
할석으로 기초를 구획한 후 벽체를 쌓고 기와를 올린 건물로 추정된다.
1호 건물지와 같은 형태의 건물지는 북한산성, 남한산성,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성곽 유적에
서 일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표 2. 조선시대 산성 출토 관련 건물지 속성표
유적명 유구번호 면적(m) 규모(칸) 성벽이격거리 추정시기
오산 독산성(2017) 1호 4.5×3.6 - 약 20m 조선후기
남한산성(2002) 1호 7.0×2.4 정면3, 측면1 약 4m 17C
남한산성(2007) 1호 6.6×2.1 정면3, 측면1 약 10m 17C
숙종이후
남산 봉수대지(2009) 4-2호 7.8×3.4 정면3, 측면1 약 10m
(17C이후)
숙종이후
북한산성(2015) 3호 7.8×3.2 정면3, 측면1 약 4m
(17C이후)
숙종이후
북한산성(2015) 4호 9×5 정면3, 측면1 약 5m
(17C이후)
여주 파사성(2014) 2호 5.9×3.9 정면2, 측면1 약 10m 15~17C
남한산성(2002) 조사에서 성벽 안쪽 4m 이격 지점에서 1호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북동향
이다. 3칸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초석간의 거리는 약 2.1m이다. 보고자는 영조척 7자
를 기준으로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지에서는 10~11㎜의 조총환 십여점과 17세기로 보
이는 자기류가 확인되어 시기를 가늠케 한다.
남한산성 암문·수구지 일대 발굴조사(2007)에서는 건물지를 초석과 석렬을 기준으로 구분
하고 상층과 하층 건물지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2개의 건물지로 본다면 약 30㎝의 높이 차이로
볼 수 있다. 건물의 중심연대는 출토 백자를 통해 17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사 대
58 노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