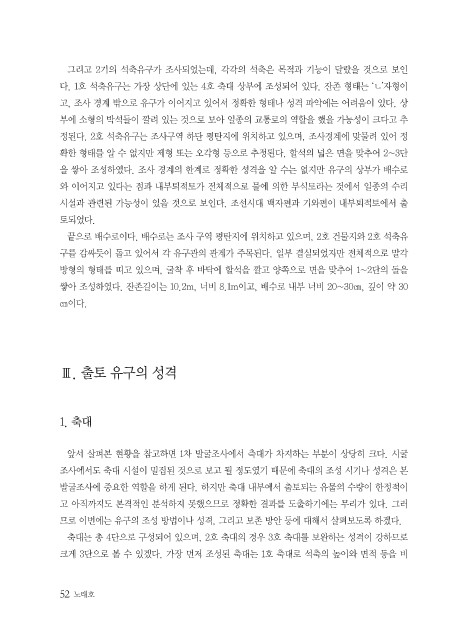Page 54 - 오산학 연구 4집
P. 54
그리고 2기의 석축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석축은 목적과 기능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
다. 1호 석축유구는 가장 상단에 있는 4호 축대 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잔존 형태는 ‘ㄴ’자형이
고, 조사 경계 밖으로 유구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형태나 성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
부에 소형의 박석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교통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
정된다. 2호 석축유구는 조사구역 하단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경계에 맞물려 있어 정
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제형 또는 오각형 등으로 추정된다. 할석의 넓은 면을 맞추어 2~3단
을 쌓아 조성하였다. 조사 경계의 한계로 정확한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유구의 상부가 배수로
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내부퇴적토가 전체적으로 물에 의한 부식토라는 것에서 일종의 수리
시설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백자편과 기와편이 내부퇴적토에서 출
토되었다.
끝으로 배수로이다. 배수로는 조사 구역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건물지와 2호 석축유
구를 감싸듯이 돌고 있어서 각 유구관의 관계가 주목된다. 일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말각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굴착 후 바닥에 할석을 깔고 양쪽으로 면을 맞추어 1~2단의 돌을
쌓아 조성하였다. 잔존길이는 10.2m, 너비 8.1m이고, 배수로 내부 너비 20~30㎝, 깊이 약 30
㎝이다.
Ⅲ. 출토 유구의 성격
1. 축대
앞서 살펴본 현황을 참고하면 1차 발굴조사에서 축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시굴
조사에서도 축대 시설이 밀집된 것으로 보고 될 정도였기 때문에 축대의 조성 시기나 성격은 본
발굴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축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량이 한정적이
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분석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
므로 이번에는 유구의 조성 방법이나 성격, 그리고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축대는 총 4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호 축대의 경우 3호 축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크게 3단으로 볼 수 있겠다. 가장 먼저 조성된 축대는 1호 축대로 석축의 높이와 면적 등을 비
52 노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