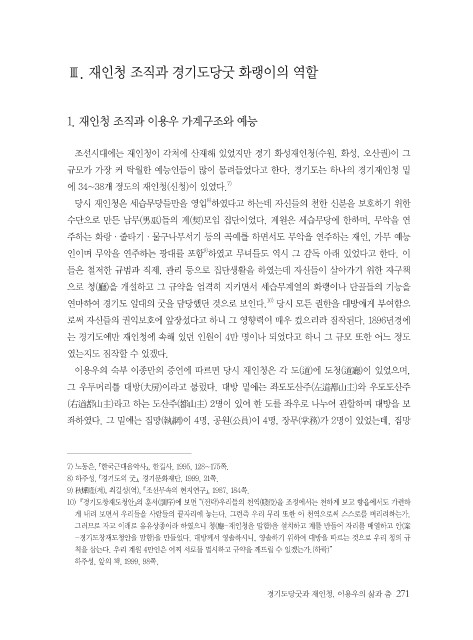Page 273 - 오산학 연구 1집
P. 273
Ⅲ. 재인청 조직과 경기도당굿 화랭이의 역할
1. 재인청 조직과 이용우 가계구조와 예능
조선시대에는 재인청이 각처에 산재해 있었지만 경기 화성재인청(수원, 화성, 오산권)이 그
규모가 가장 커 탁월한 예능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하나의 경기재인청 밑
에 34~38개 정도의 재인청(신청)이 있었다. 7)
8)
당시 재인청은 세습무당들만을 영입 하였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천한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남무(男巫)들의 계(契)모임 집단이었다. 계원은 세습무당에 한하며, 무악을 연
주하는 화랑·줄타기·물구나무서기 등의 곡예를 하면서도 무악을 연주하는 재인, 가무 예능
9)
인이며 무악을 연주하는 광대를 포함 하였고 무녀들도 역시 그 감독 아래 있었다고 한다. 이
들은 철저한 규범과 직제, 관리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
으로 청(廳)을 개설하고 그 규약을 엄격히 지키면서 세습무계열의 화랭이나 단골들의 기능을
10)
연마하여 경기도 일대의 굿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든 권한을 대방에게 부여함으
로써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1896년경에
는 경기도에만 재인청에 속해 있던 인원이 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 또한 어느 정도
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용우의 숙부 이종만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재인청은 각 도(道)에 도청(道廳)이 있었으며,
그 우두머리를 대방(大房)이라고 불렀다. 대방 밑에는 좌도도산주(左道都山主)와 우도도산주
(右道都山主)라고 하는 도산주(都山主) 2명이 있어 한 도를 좌우로 나누어 관할하며 대방을 보
좌하였다. 그 밑에는 집망(執網)이 4명, 공원(公員)이 4명, 장무(掌務)가 2명이 있었는데, 집망
7)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한길사, 1995, 128~175쪽.
8) 하주성, 『경기도의 굿』, 경기문화재단, 1999, 21쪽.
9) 秋燁隆(저), 최길성(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1987, 184쪽.
10) 『경기도창재도청안』의 훈서(訓序)에 보면 “(전략)우리들의 천역(賤役)을 조정에서는 천하게 보고 향읍에서도 가련하
게 내려 보면서 우리들을 사람들의 끝자리에 놓는다. 그런즉 우리 무리 또한 이 천역으로써 스스로를 버리려하는가.
그러므로 자고 이래로 유유상종이라 하였으니 청(廳-재인청을 말함)을 설치하고 계를 만들어 자리를 배열하고 안(案
-경기도창재도청안을 말함)을 만들었다. 대방께서 영솔하시니, 영솔하기 위하여 대방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 청의 규
칙을 삼는다. 우리 계원 4만인은 어찌 서로를 멸시하고 규약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하락)”
하주성, 앞의 책, 1999, 98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