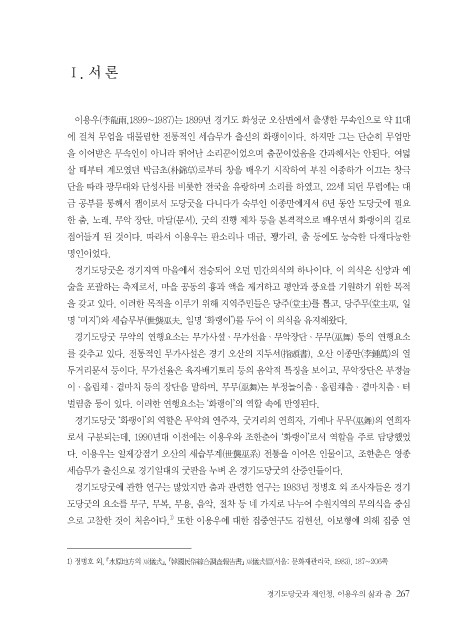Page 269 - 오산학 연구 1집
P. 269
Ⅰ. 서 론
이용우(李龍雨,1899~1987)는 1899년 경기도 화성군 오산면에서 출생한 무속인으로 약 11대
에 걸쳐 무업을 대물림한 전통적인 세습무가 출신의 화랭이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무업만
을 이어받은 무속인이 아니라 뛰어난 소리꾼이었으며 춤꾼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덟
살 때부터 계모였던 박금초(朴錦草)로부터 창을 배우기 시작하여 부친 이종하가 이끄는 창극
단을 따라 광무대와 단성사를 비롯한 전국을 유랑하며 소리를 하였고, 22세 되던 무렵에는 대
금 공부를 통해서 잽이로서 도당굿을 다니다가 숙부인 이종만에게서 6년 동안 도당굿에 필요
한 춤, 노래, 무악 장단, 마달(문서), 굿의 진행 제차 등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화랭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용우는 판소리나 대금, 꽹가리, 춤 등에도 능숙한 다재다능한
명인이었다.
경기도당굿은 경기지역 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던 민간의식의 하나이다. 이 의식은 신앙과 예
술을 포괄하는 축제로서, 마을 공동의 흉과 액을 제거하고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당주(堂主)를 뽑고, 당주무(堂主巫, 일
명 ‘미지’)와 세습무부(世襲巫夫, 일명 ‘화랭이’)를 두어 이 의식을 유지해왔다.
경기도당굿 무악의 연행요소는 무가사설ㆍ무가선율ㆍ무악장단ㆍ무무(巫舞) 등의 연행요소
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무가사설은 경기 오산의 지두서(指頭書), 오산 이종만(李鍾萬)의 열
두거리문서 등이다. 무가선율은 육자배기토리 등의 음악적 특징을 보이고, 무악장단은 부정놀
이ㆍ올림채ㆍ곁마치 등의 장단을 말하며, 무무(巫舞)는 부정놀이춤ㆍ올림채춤ㆍ곁마치춤ㆍ터
벌림춤 등이 있다. 이러한 연행요소는 ‘화랭이’의 역할 속에 반영된다.
경기도당굿 ‘화랭이’의 역할은 무악의 연주자, 굿거리의 연희자, 기예나 무무(巫舞)의 연희자
로서 구분되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이용우와 조한춘이 ‘화랭이’로서 역할을 주로 담당했었
다. 이용우는 일제강점기 오산의 세습무계(世襲巫系) 전통을 이어온 인물이고, 조한춘은 영종
세습무가 출신으로 경기일대의 굿판을 누벼 온 경기도당굿의 산증인들이다.
경기도당굿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춤과 관련한 연구는 1983년 정병호 외 조사자들은 경기
도당굿의 요소를 무구, 무복, 무용, 음악, 절차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수원지역의 무의식을 중심
1)
으로 고찰한 것이 처음이다. 또한 이용우에 대한 집중연구도 김헌선, 이보형에 의해 집중 연
1) 정병호 외, 「水原地方의 巫儀式』,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巫儀式偏(서울: 문화재관리국, 1983), 187~206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