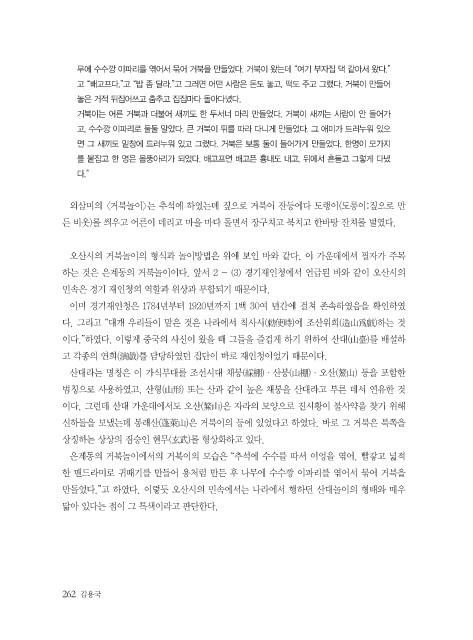Page 264 - 오산학 연구 1집
P. 264
무에 수수깡 이파리를 엮어서 묶어 거북을 만들었다. 거북이 왔는데 “여기 부자집 댁 같아서 왔다.”
고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도 놓고, 떡도 주고 그랬다. 거북이 만들어
놓은 거적 뒤집어쓰고 춤추고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거북이는 어른 거북과 더불어 새끼도 한 두서너 마리 만들었다. 거북이 새끼는 사람이 안 들어가
고, 수수깡 이파리로 둘둘 말았다. 큰 거북이 뒤를 따라 다니게 만들었다. 그 애미가 드러누워 있으
면 그 새끼도 밑창에 드러누워 있고 그랬다. 거북은 보통 둘이 들어가게 만들었다. 한명이 모가지
를 붙잡고 한 명은 몸뚱아리가 되었다. 배고프면 배고픈 흉내도 내고, 뒤에서 흔들고 그렇게 다녔
다.”
외삼미의 <거북놀이>는 추석에 하였는데 짚으로 거북이 잔등에다 도랭이(도롱이:짚으로 만
든 비옷)를 씌우고 어른이 데리고 마을 마다 돌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오산시의 거북놀이의 형식과 놀이방법은 위에 보인 바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필자가 주목
하는 것은 은계동의 거북놀이이다. 앞서 2 - (3) 경기재인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산시의
민속은 경기 재인청의 역할과 위상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재인청은 1784년부터 1920년까지 1백 30여 년간에 걸쳐 존속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대개 우리들이 맡은 것은 나라에서 칙사시(勅使時)에 조산위희(造山爲戱)하는 것
이다.”하였다. 이렇게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산대(山臺)를 배설하
고 각종의 연희(演戱)를 담당하였던 집단이 바로 재인청이었기 때문이다.
산대라는 명칭은 이 가식무대를 조선시대 채붕(綵棚)·산붕(山棚)·오산(鰲山) 등을 포함한
범칭으로 사용하였고, 산형(山形) 또는 산과 같이 높은 채붕을 산대라고 부른 데서 연유한 것
이다. 그런데 산대 가운데에서도 오산(鰲山)은 자라의 모양으로 진시황이 불사약을 찾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는데 봉래산(蓬萊山)은 거북이의 등에 있었다고 하였다. 바로 그 거북은 북쪽을
상징하는 상상의 짐승인 현무(玄武)를 형상화하고 있다.
은계동의 거북놀이에서의 거북이의 모습은 “추석에 수수를 따서 이엉을 엮어. 빨갛고 넓적
한 맨드라미로 귀때기를 만들어 용처럼 만든 후 나무에 수수깡 이파리를 엮어서 묶어 거북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오산시의 민속에서는 나라에서 행하던 산대놀이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 그 특색이라고 판단한다.
262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