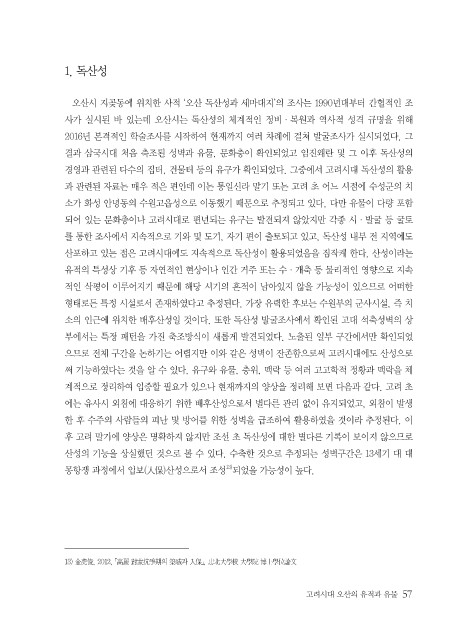Page 59 - 오산문화총서 8집
P. 59
1. 독산성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조사는 1990년대부터 간헐적인 조
사가 실시된 바 있는데 오산시는 독산성의 체계적인 정비·복원과 역사적 성격 규명을 위해
2016년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 처음 축조된 성벽과 유물,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임진왜란 및 그 이후 독산성의
경영과 관련된 다수의 집터, 건물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고려시대 독산성의 활용
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통일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 어느 시점에 수성군의 치
소가 화성 안녕동의 수원고읍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유물이 다량 포함
되어 있는 문화층이나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종 시·발굴 등 굴토
를 통한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기와 및 도기, 자기 편이 출토되고 있고, 독산성 내부 전 지역에도
산포하고 있는 점은 고려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독산성이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산성이라는
유적의 특성상 기후 등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 거주 또는 수·개축 등 물리적인 영향으로 지속
적인 삭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특정 시설로서 존재하였다고 추정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수원부의 군사시설, 즉 치
소의 인근에 위치한 배후산성일 것이다. 또한 독산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고대 석축성벽의 상
부에서는 특정 패턴을 가진 축조방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노출된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었
으므로 전체 구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성벽이 잔존함으로써 고려시대에도 산성으로
써 기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구와 유물, 층위, 맥락 등 여러 고고학적 정황과 맥락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초
에는 유사시 외침에 대응하기 위한 배후산성으로서 별다른 관리 없이 유지되었고, 외침이 발생
한 후 수주의 사람들의 피난 및 방어를 위한 성벽을 급조하여 활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후 고려 말기에 양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 초 독산성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산성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구간은 13세기 대 대
13)
몽항쟁 과정에서 입보(入保)산성으로서 조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 金虎俊, 2012, 「高麗 對蒙抗爭期의 築城과 入保」,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고려시대 오산의 유적과 유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