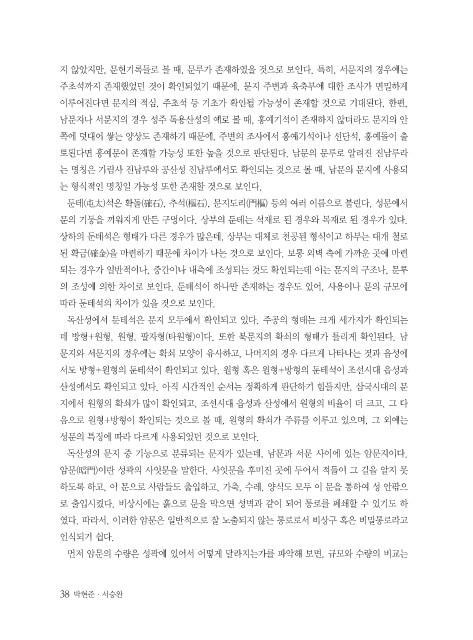Page 40 - 오산문화총서 8집
P. 40
지 않았지만, 문헌기록들로 볼 때, 문루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문지의 경우에는
주초석까지 존재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지 주변과 육축부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지의 적심, 주초석 등 기초가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문지나 서문지의 경우 성주 독용산성의 예로 볼 때, 홍예기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문지의 안
쪽에 덧대어 쌓는 양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의 조사에서 홍예기석이나 선단석, 홍예돌이 출
토된다면 홍예문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문의 문루로 알려진 진남루라
는 명칭은 기림사 진남루와 공산성 진남루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남문의 문지에 사용되
는 형식적인 명칭일 가능성 또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둔테(屯太)석은 확돌(確石), 추석(樞石), 문지도리(門樞)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성문에서
문의 기둥을 끼워지게 만든 구멍이다. 상부의 둔테는 석재로 된 경우와 목재로 된 경우가 있다.
상하의 둔테석은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상부는 대체로 천공된 형식이고 하부는 대개 철로
된 확금(確金)을 마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외벽 측에 가까운 곳에 마련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중간이나 내측에 조성되는 것도 확인되는데 이는 문지의 구조나, 문루
의 조성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둔테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이나 문의 규모에
따라 둔테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산성에서 둔테석은 문지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공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가 확인되는
데 방형+원형, 원형, 팔자형(타원형)이다. 또한 북문지의 확쇠의 형태가 틀리게 확인된다. 남
문지와 서문지의 경우에는 확쇠 모양이 유사하고, 나머지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읍성에
서도 방형+원형의 둔테석이 확인되고 있다. 원형 혹은 원형+방형의 둔테석이 조선시대 읍성과
산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직 시간적인 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삼국시대의 문
지에서 원형의 확쇠가 많이 확인되고, 조선시대 읍성과 산성에서 원형의 비율이 더 크고, 그 다
음으로 원형+방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원형의 확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성문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산성의 문지 중 기능으로 분류되는 문지가 있는데, 남문과 서문 사이에 있는 암문지이다.
암문(暗門)이란 성곽의 사잇문을 말한다. 사잇문을 후미진 곳에 두어서 적들이 그 길을 알지 못
하도록 하고, 이 문으로 사람들도 출입하고, 가축, 수레, 양식도 모두 이 문을 통하여 성 안팎으
로 출입시켰다. 비상시에는 흙으로 문을 막으면 성벽과 같이 되어 통로를 폐쇄할 수 있기도 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암문은 일반적으로 잘 노출되지 않는 통로로서 비상구 혹은 비밀통로라고
인식되기 쉽다.
먼저 암문의 수량은 성곽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해 보면, 규모와 수량의 비교는
38 박현준·서승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