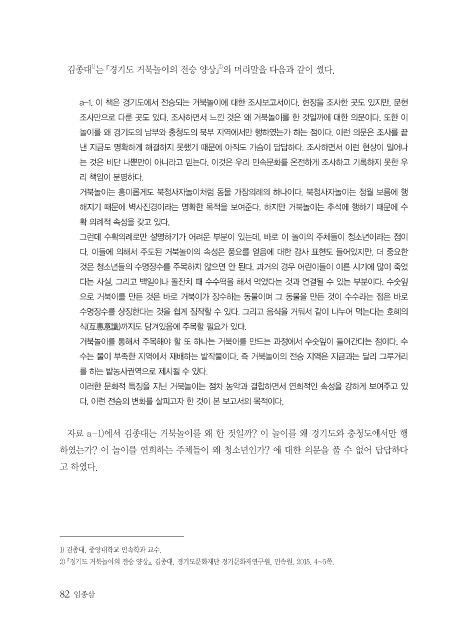Page 84 - 오산학 연구 6집
P. 84
1)
2)
김종대 는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의 머리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a-1. 이 책은 경기도에서 전승되는 거북놀이에 대한 조사보고서이다. 현장을 조사한 곳도 있지만, 문헌
조사만으로 다룬 곳도 있다.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왜 거북놀이를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이
놀이를 왜 경기도의 남부와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서만 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문은 조사를 끝
낸 지금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다. 조사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 민속문화를 온전하게 조사하고 기록하지 못한 우
리 책임이 분명하다.
거북놀이는 흥미롭게도 북청사자놀이처럼 동물 가장의례의 하나이다. 북청사자놀이는 정월 보름에 행
해지기 때문에 벽사진경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북놀이는 추석에 행하기 때문에 수
확 의례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확의례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놀이의 주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다. 이들에 의해서 주도된 거북놀이의 속성은 풍요를 얻음에 대한 감사 표현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수명장수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경우 어린이들이 이른 시기에 많이 죽었
다는 사실, 그리고 백일이나 돌잔치 때 수수떡을 해서 먹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숫잎
으로 거북이를 만든 것은 바로 거북이가 장수하는 동물이며 그 동물을 만든 것이 수수라는 점은 바로
수명장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거둬서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호혜의
식(互惠意識)까지도 담겨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북놀이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거북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숫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수
수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이다. 즉 거북놀이의 전승 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그루거리
를 하는 밭농사권역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거북놀이는 점차 농악과 결합하면서 연희적인 속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
다. 이런 전승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자료 a-1)에서 김종대는 거북놀이를 왜 한 것일까? 이 놀이를 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만 행
하였는가? 이 놀이를 연희하는 주체들이 왜 청소년인가? 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어 답답하다
고 하였다.
1) 김종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2)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 양상』, 김종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민속원, 2015. 4~5쪽.
82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