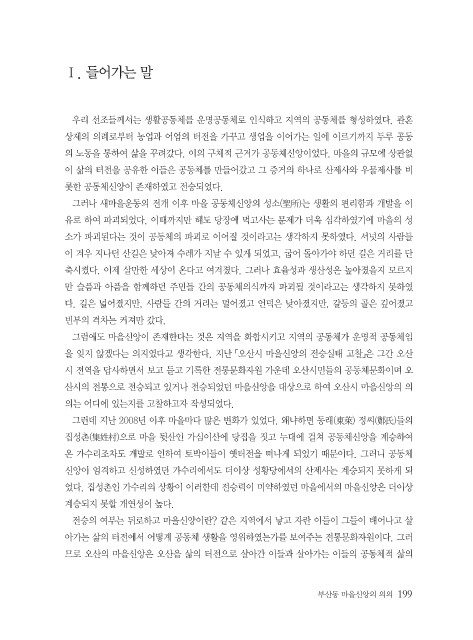Page 201 - 오산학 연구 6집
P. 201
Ⅰ. 들어가는 말
우리 선조들께서는 생활공동체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관혼
상제의 의례로부터 농업과 어업의 터전을 가꾸고 생업을 이어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동
의 노동을 통하여 삶을 꾸려갔다. 이의 구체적 근거가 공동체신앙이었다. 마을의 규모에 상관없
이 삶의 터전을 공유한 이들은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그 증거의 하나로 산제사와 우물제사를 비
롯한 공동체신앙이 존재하였고 전승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전개 이후 마을 공동체신앙의 성소(聖所)는 생활의 편리함과 개발을 이
유로 하여 파괴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기에 마을의 성
소가 파괴된다는 것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서넛의 사람들
이 겨우 지나던 산길은 낮아져 수레가 지날 수 있게 되었고, 굽어 돌아가야 하던 길은 거리를 단
축시켰다.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온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
만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던 주민들 간의 공동체의식까지 파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
다. 길은 넓어졌지만, 사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언덕은 낮아졌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빈부의 격차는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마을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을 화합시키고 지역의 공동체가 운명적 공동체임
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오산시 마을신앙의 전승실태 고찰」은 그간 오산
시 전역을 답사하면서 보고 듣고 기록한 전통문화자원 가운데 오산시민들의 공동체문화이며 오
산시의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거나 전승되었던 마을신앙을 대상으로 하여 오산시 마을신앙의 의
의는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 마을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동래(東萊) 정씨(鄭氏)들의
집성촌(集姓村)으로 마을 뒷산인 가심이산에 당집을 짓고 누대에 걸쳐 공동체신앙을 계승하여
온 가수리조차도 개발로 인하여 토박이들이 옛터전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동체
신앙이 엄격하고 신성하였던 가수리에서도 더이상 성황당에서의 산제사는 계승되지 못하게 되
었다. 집성촌인 가수리의 상황이 이러한데 전승력이 미약하였던 마을에서의 마을신앙은 더이상
계승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전승의 여부는 뒤로하고 마을신앙이란? 같은 지역에서 낳고 자란 이들이 그들이 태어나고 살
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전통문화자원이다. 그러
므로 오산의 마을신앙은 오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간 이들과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적 삶의
부산동 마을신앙의 의의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