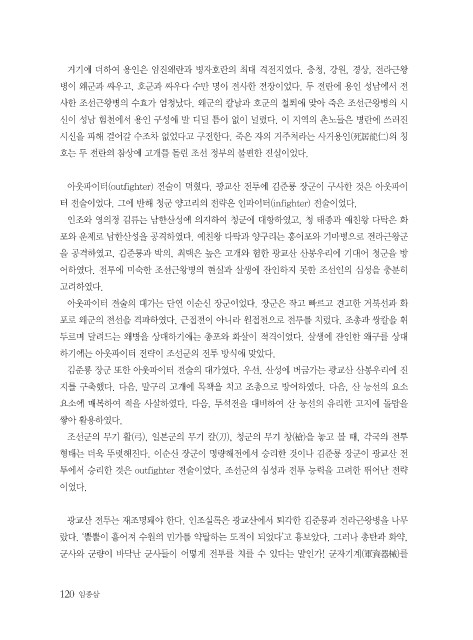Page 122 - 오산문화총서 7집
P. 122
거기에 더하여 용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최대 격전지였다. 충청, 강원, 경상, 전라근왕
병이 왜군과 싸우고, 호군과 싸우다 수만 명이 전사한 전장이었다. 두 전란에 용인 성남에서 전
사한 조선근왕병의 수효가 엄청났다. 왜군의 칼날과 호군의 철퇴에 맞아 죽은 조선근왕병의 시
신이 성남 험천에서 용인 구성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널렸다. 이 지역의 촌노들은 병란에 쓰러진
시신을 피해 걸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구전한다. 죽은 자의 거주처라는 사거용인(死居龍仁)의 칭
호는 두 전란의 참상에 고개를 돌린 조선 정부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아웃파이터(outfighter) 전술이 먹혔다. 광교산 전투에 김준룡 장군이 구사한 것은 아웃파이
터 전술이었다. 그에 반해 청군 양고리의 전략은 인파이터(infighter) 전술이었다.
인조와 영의정 김류는 남한산성에 의지하여 청군에 대항하였고, 청 태종과 예친왕 다탁은 화
포와 운제로 남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예친왕 다탁과 양구리는 홍이포와 기마병으로 전라근왕군
을 공격하였고, 김준룡과 박의, 최택은 높은 고개와 험한 광교산 산봉우리에 기대어 청군을 방
어하였다. 전투에 미숙한 조선근왕병의 현실과 살생에 잔인하지 못한 조선인의 심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아웃파이터 전술의 대가는 단연 이순신 장군이었다. 장군은 작고 빠르고 견고한 거북선과 화
포로 왜군의 전선을 격파하였다. 근접전이 아니라 원접전으로 전투를 치렀다. 조총과 쌍칼을 휘
두르며 달려드는 왜병을 상대하기에는 총포와 화살이 적격이었다. 살생에 잔인한 왜구를 상대
하기에는 아웃파이터 전략이 조선군의 전투 방식에 맞았다.
김준룡 장군 또한 아웃파이터 전술의 대가였다. 우선, 산성에 버금가는 광교산 산봉우리에 진
지를 구축했다. 다음, 말구리 고개에 목책을 치고 조총으로 방어하였다. 다음, 산 능선의 요소
요소에 매복하여 적을 사살하였다. 다음, 투석전을 대비하여 산 능선의 유리한 고지에 돌탑을
쌓아 활용하였다.
조선군의 무기 활(弓), 일본군의 무기 칼(刀), 청군의 무기 창(槍)을 놓고 볼 때, 각국의 전투
형태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것이나 김준룡 장군이 광교산 전
투에서 승리한 것은 outfighter 전술이었다. 조선군의 심성과 전투 능력을 고려한 뛰어난 전략
이었다.
광교산 전투는 재조명돼야 한다. 인조실록은 광교산에서 퇴각한 김준룡과 전라근왕병을 나무
랐다. ‘뿔뿔이 흩어져 수원의 민가를 약탈하는 도적이 되었다’고 흉보았다. 그러나 총탄과 화약,
군사와 군량이 바닥난 군사들이 어떻게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인가! 군자기계(軍資器械)를
120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