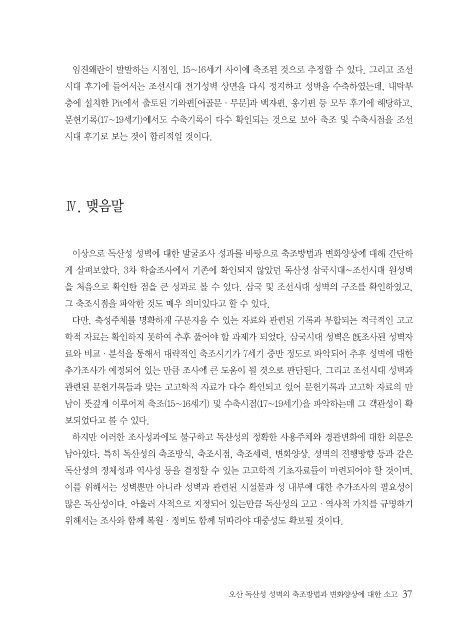Page 39 - 오산학 연구 5집
P. 39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시점인, 15~16세기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 후기에 들어서는 조선시대 전기성벽 상면을 다시 정지하고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내탁부
층에 설치한 Pit에서 출토된 기와편[어골문·무문]과 백자편, 옹기편 등 모두 후기에 해당하고,
문헌기록(17~19세기)에서도 수축기록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축조 및 수축시점을 조선
시대 후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독산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축조방법과 변화양상에 대해 간단하
게 살펴보았다. 3차 학술조사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독산성 삼국시대~조선시대 원성벽
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삼국 및 조선시대 성벽의 구조를 확인하였고,
그 축조시점을 파악한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축성주체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자료와 관련된 기록과 부합되는 적극적인 고고
학적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여 추후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삼국시대 성벽은 旣조사된 성벽자
료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인 축조시기가 7세기 중반 정도로 파악되어 추후 성벽에 대한
추가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성벽과
관련된 문헌기록들과 맞는 고고학적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만
남이 뜻깊게 이루어져 축조(15~16세기) 및 수축시점(17~19세기)을 파악하는데 그 객관성이 확
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산성의 정확한 사용주체와 경관변화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특히 독산성의 축조방식, 축조시점, 축조세력, 변화양상, 성벽의 진행방향 등과 같은
독산성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기초자료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벽뿐만 아니라 성벽과 관련된 시설물과 성 내부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많은 독산성이다. 아울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독산성의 고고·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함께 복원·정비도 함께 뒤따라야 대중성도 확보될 것이다.
오산 독산성 성벽의 축조방법과 변화양상에 대한 소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