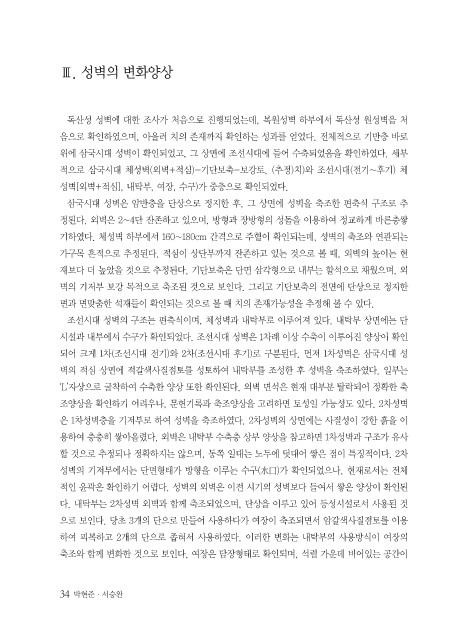Page 36 - 오산학 연구 5집
P. 36
Ⅲ. 성벽의 변화양상
독산성 성벽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복원성벽 하부에서 독산성 원성벽을 처
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치의 존재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체적으로 기반층 바로
위에 삼국시대 성벽이 확인되었고, 그 상면에 조선시대에 들어 수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적으로 삼국시대 체성벽(외벽+적심)-기단보축-보강토, (추정)치)와 조선시대(전기~후기) 체
성벽[외벽+적심], 내탁부, 여장, 수구)가 중층으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성벽은 암반층을 단상으로 정지한 후, 그 상면에 성벽을 축조한 편축식 구조로 추
정된다. 외벽은 2~4단 잔존하고 있으며, 방형과 장방형의 성돌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바른층쌓
기하였다. 체성벽 하부에서 160~180cm 간격으로 주혈이 확인되는데, 성벽의 축조와 연관되는
가구목 흔적으로 추정된다. 적심이 상단부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외벽의 높이는 현
재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보축은 단면 삼각형으로 내부는 할석으로 채웠으며, 외
벽의 기저부 보강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단보축의 전면에 단상으로 정지한
면과 면맞춤한 석재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치의 존재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성벽의 구조는 편축식이며, 체성벽과 내탁부로 이루어져 있다. 내탁부 상면에는 단
시설과 내부에서 수구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성벽은 1차례 이상 수축이 이루어진 양상이 확인
되어 크게 1차(조선시대 전기)와 2차(조선시대 후기)로 구분된다. 먼저 1차성벽은 삼국시대 성
벽의 적심 상면에 적갈색사질점토를 성토하여 내탁부를 조성한 후 성벽을 축조하였다. 일부는
‘L’자상으로 굴착하여 수축한 양상 또한 확인된다. 외벽 면석은 현재 대부분 탈락되어 정확한 축
조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문헌기록과 축조양상을 고려하면 토성일 가능성도 있다. 2차성벽
은 1차성벽층을 기저부로 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2차성벽의 상면에는 사질성이 강한 흙을 이
용하여 층층히 쌓아올렸다. 외벽은 내탁부 수축층 상부 양상을 참고하면 1차성벽과 구조가 유사
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하지는 않으며, 동쪽 일대는 노두에 덧대어 쌓은 점이 특징적이다. 2차
성벽의 기저부에서는 단면형태가 방형을 이루는 수구(水口)가 확인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전체
적인 윤곽은 확인하기 어렵다. 성벽의 외벽은 이전 시기의 성벽보다 들여서 쌓은 양상이 확인된
다. 내탁부는 2차성벽 외벽과 함께 축조되었으며, 단상을 이루고 있어 등성시설로서 사용된 것
으로 보인다. 당초 3개의 단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여장이 축조되면서 암갈색사질점토를 이용
하여 피복하고 2개의 단으로 좁혀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내탁부의 사용방식이 여장의
축조와 함께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장은 담장형태로 확인되며, 석렬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34 박현준·서승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