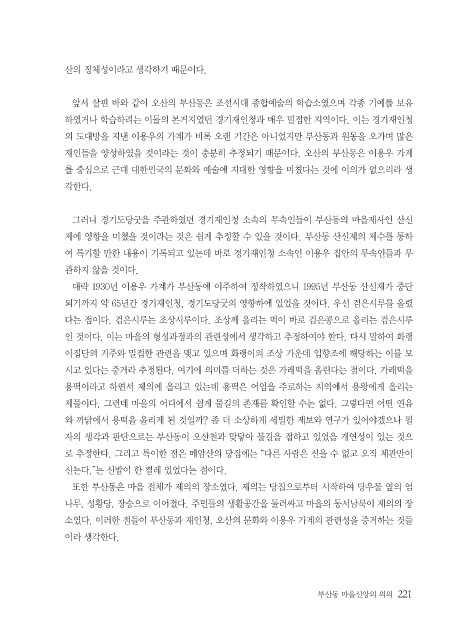Page 223 - 오산학 연구 6집
P. 223
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산의 부산동은 조선시대 종합예술의 학습소였으며 각종 기예를 보유
하였거나 학습하려는 이들의 본거지였던 경기재인청과 매우 밀접한 지역이다. 이는 경기재인청
의 도대방을 지낸 이용우의 가계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부산동과 원동을 오가며 많은
재인들을 양성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추정되기 때문이다. 오산의 부산동은 이용우 가계
를 중심으로 근대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이의가 없으리라 생
각한다.
그러니 경기도당굿을 주관하였던 경기재인청 소속의 무속인들이 부산동의 마을제사인 산신
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동 산신제의 제수를 통하
여 특기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경기재인청 소속인 이용우 집안의 무속인들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략 1930년 이용우 가계가 부산동에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니 1995년 부산동 산신제가 중단
되기까지 약 65년간 경기재인청, 경기도당굿의 영향하에 있었을 것이다. 우선 검은시루를 올렸
다는 점이다. 검은시루는 조상시루이다. 조상께 올리는 떡이 바로 검은콩으로 올리는 검은시루
인 것이다. 이는 마을의 형성과정과의 관련성에서 생각하고 추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화랭
이집단의 거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화랭이의 조상 가운데 입향조에 해당하는 이를 모
시고 있다는 증거라 추정된다. 여기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가래떡을 올린다는 점이다. 가래떡을
용떡이라고 하면서 제의에 올리고 있는데 용떡은 어업을 주로하는 지역에서 용왕에게 올리는
제물이다. 그런데 마을의 어디에서 쉽게 물길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
와 까닭에서 용떡을 올리게 된 것일까? 좀 더 소상하게 세밀한 제보와 연구가 있어야겠으나 필
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부산동이 오산천과 맞닿아 물길을 접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매암산의 당집에는 “다른 사람은 신을 수 없고 오직 제관만이
신는다.”는 신발이 한 켤레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부산동은 마을 전체가 제의의 장소였다. 제의는 당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우물 옆의 엄
나무, 성황당, 장승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둘러싸고 마을의 동서남북이 제의의 장
소였다. 이러한 점들이 부산동과 재인청, 오산의 문화와 이용우 가계의 관련성을 증거하는 것들
이라 생각한다.
부산동 마을신앙의 의의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