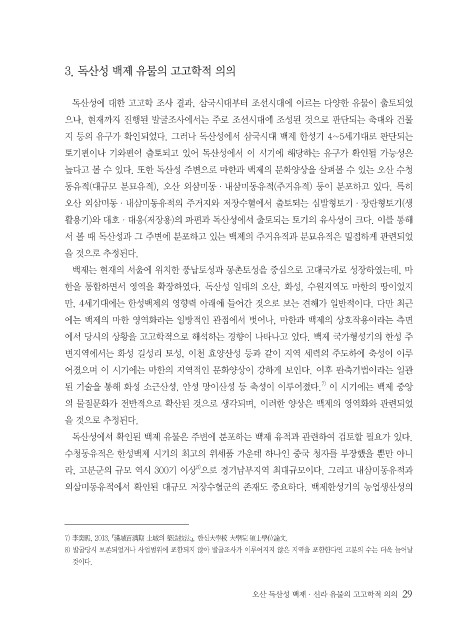Page 31 - 오산학 연구 4집
P. 31
3. 독산성 백제 유물의 고고학적 의의
독산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
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축대와 건물
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산성에서 삼국시대 백제 한성기 4~5세기대로 판단되는
토기편이나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어 독산성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산성 주변으로 마한과 백제의 문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오산 수청
동유적(대규모 분묘유적), 오산 외삼미동·내삼미동유적(주거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오산 외삼미동·내삼미동유적의 주거지와 저장수혈에서 출토되는 심발형토기·장란형토기(생
활용기)와 대호·대옹(저장용)의 파편과 독산성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유사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서 볼 때 독산성과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의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은 밀접하게 관련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현재의 서울에 위치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는데, 마
한을 통합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다. 독산성 일대의 오산, 화성, 수원지역도 마한의 땅이었지
만, 4세기대에는 한성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에는 백제의 마한 영역화라는 일방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마한과 백제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
에서 당시의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백제 국가형성기의 한성 주
변지역에서는 화성 길성리 토성, 이천 효양산성 등과 같이 지역 세력의 주도하에 축성이 이루
어졌으며 이 시기에는 마한의 지역적인 문화양상이 강하게 보인다. 이후 판축기법이라는 일관
7)
된 기술을 통해 화성 소근산성, 안성 망이산성 등 축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백제 중앙
의 물질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양상은 백제의 영역화와 관련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산성에서 확인된 백제 유물은 주변에 분포하는 백제 유적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청동유적은 한성백제 시기의 최고의 위세품 가운데 하나인 중국 청자를 부장했을 뿐만 아니
8)
라, 고분군의 규모 역시 300기 이상 으로 경기남부지역 최대규모이다. 그리고 내삼미동유적과
외삼미동유적에서 확인된 대규모 저장수혈군의 존재도 중요하다. 백제한성기의 농업생산성의
7) 李奕熙, 2013, 『漢城百濟期 土城의 築造技法』, 한신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발굴당시 보존되었거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면 고분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산 독산성 백제·신라 유물의 고고학적 의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