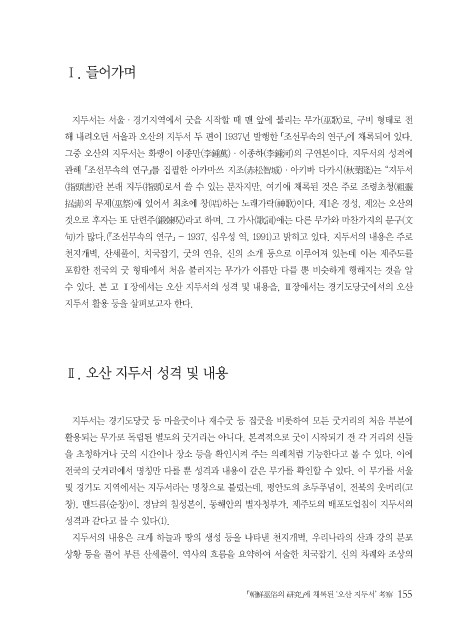Page 157 - 오산문화총서 7집
P. 157
Ⅰ. 들어가며
지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굿을 시작할 때 맨 앞에 불리는 무가(巫歌)로, 구비 형태로 전
해 내려오던 서울과 오산의 지두서 두 편이 1937년 발행한 『조선무속의 연구』에 채록되어 있다.
그중 오산의 지두서는 화랭이 이종만(李鍾萬)·이종하(李鍾河)의 구연본이다. 지두서의 성격에
관해 『조선무속의 연구』를 집필한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지두서
(指頭書)란 본래 지두(指頭)로서 쓸 수 있는 문자지만, 여기에 채록된 것은 주로 조령초청(祖靈
招請)의 무제(巫祭)에 있어서 최초에 창(唱)하는 노래가락(神歌)이다. 제1은 경성, 제2는 오산의
것으로 후자는 또 단련주(鍛鍊呪)라고 하며, 그 가사(歌詞)에는 다른 무가와 마찬가지의 문구(文
句)가 많다.(『조선무속의 연구』 - 1937, 심우성 역, 1991)고 밝히고 있다. 지두서의 내용은 주로
천지개벽, 산세풀이, 치국잡기, 굿의 연유, 신의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굿 형태에서 처음 불러지는 무가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하게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 Ⅱ장에서는 오산 지두서의 성격 및 내용을, Ⅲ장에서는 경기도당굿에서의 오산
지두서 활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오산 지두서 성격 및 내용
지두서는 경기도당굿 등 마을굿이나 재수굿 등 집굿을 비롯하여 모든 굿거리의 처음 부분에
활용되는 무가로 독립된 별도의 굿거리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기 전 각 거리의 신들
을 초청하거나 굿의 시간이나 장소 등을 확인시켜 주는 의례처럼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국의 굿거리에서 명칭만 다를 뿐 성격과 내용이 같은 무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무가를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두서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평안도의 초두푸념이, 전북의 웃머리(고
창), 맨드름(순창)이, 경남의 칠성본이, 동해안의 별자청부가, 제주도의 배포도업침이 지두서의
성격과 같다고 볼 수 있다(1).
지두서의 내용은 크게 하늘과 땅의 생성 등을 나타낸 천지개벽, 우리나라의 산과 강의 분포
상황 등을 풀어 부른 산세풀이, 역사의 흐름을 요약하여 서술한 치국잡기, 신의 차례와 조상의
「朝鮮巫俗의 硏究」에 채록된 ‘오산 지두서’ 考察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