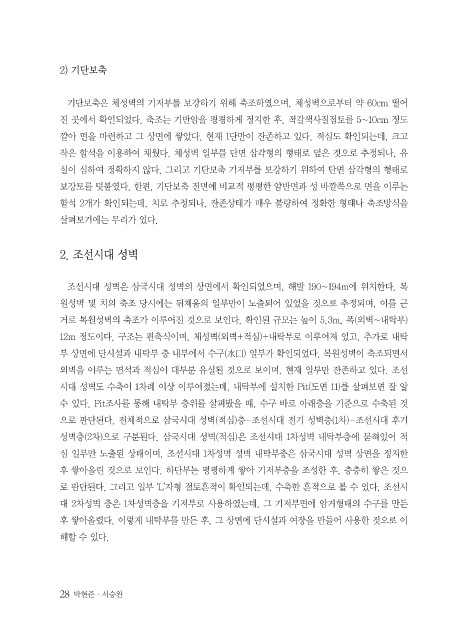Page 30 - 오산학 연구 5집
P. 30
2) 기단보축
기단보축은 체성벽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해 축조하였으며, 체성벽으로부터 약 60cm 떨어
진 곳에서 확인되었다. 축조는 기반암을 평평하게 정지한 후, 적갈색사질점토를 5~10cm 정도
깔아 면을 마련하고 그 상면에 쌓았다. 현재 1단만이 잔존하고 있다. 적심도 확인되는데,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체성벽 일부를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덮은 것으로 추정되나, 유
실이 심하여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기단보축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보강토를 덧붙였다. 한편, 기단보축 전면에 비교적 평평한 암반면과 성 바깥쪽으로 면을 이루는
할석 2개가 확인되는데, 치로 추정되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확한 형태나 축조방식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선시대 성벽
조선시대 성벽은 삼국시대 성벽의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190~194m에 위치한다. 복
원성벽 및 치의 축조 당시에는 뒤채움의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
거로 복원성벽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규모는 높이 5.3m, 폭(외벽~내탁부)
12m 정도이다. 구조는 편축식이며, 체성벽(외벽+적심)+내탁부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내탁
부 상면에 단시설과 내탁부 층 내부에서 수구(水口) 일부가 확인되었다. 복원성벽이 축조되면서
외벽을 이루는 면석과 적심이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성벽도 수축이 1차례 이상 이루어졌는데, 내탁부에 설치한 Pit(도면 11)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Pit조사를 통해 내탁부 층위를 살펴봤을 때, 수구 바로 아래층을 기준으로 수축된 것
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성벽(적심)층-조선시대 전기 성벽층(1차)-조선시대 후기
성벽층(2차)으로 구분된다. 삼국시대 성벽(적심)은 조선시대 1차성벽 내탁부층에 묻혀있어 적
심 일부만 노출된 상태이며, 조선시대 1차성벽 성벽 내탁부층은 삼국시대 성벽 상면을 정지한
후 쌓아올린 것으로 보인다. 하단부는 평평하게 쌓아 기저부층을 조성한 후, 층층히 쌓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L’자형 절토흔적이 확인되는데, 수축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
대 2차성벽 층은 1차성벽층을 기저부로 사용하였는데, 그 기저부면에 암거형태의 수구를 만든
후 쌓아올렸다. 이렇게 내탁부를 만든 후, 그 상면에 단시설과 여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28 박현준·서승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