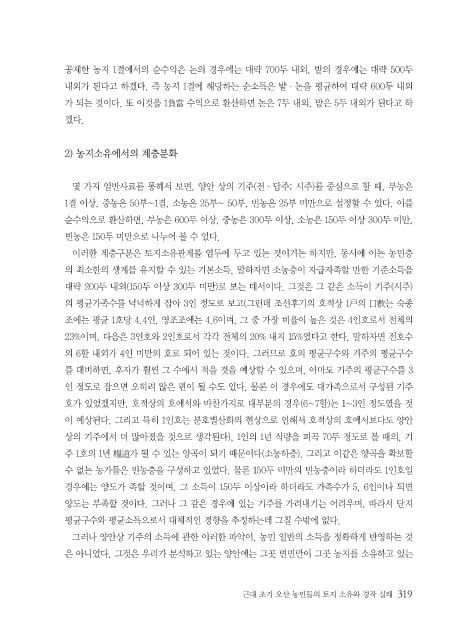Page 321 - 오산학 연구 5집
P. 321
공제한 농지 1결에서의 순수익은 논의 경우에는 대략 700두 내외, 밭의 경우에는 대략 500두
내외가 된다고 하겠다. 즉 농지 1결에 해당하는 순소득은 밭·논을 평균하여 대략 600두 내외
가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을 1負當 수익으로 환산하면 논은 7두 내외, 밭은 5두 내외가 된다고 하
겠다.
2) 농지소유에서의 계층분화
몇 가지 일반사료를 통해서 보면, 양안 상의 기주(전·답주; 시주)를 중심으로 할 때, 부농은
1결 이상, 중농은 50부~1결, 소농은 25부~ 50부, 빈농은 25부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순수익으로 환산하면, 부농은 600두 이상, 중농은 300두 이상, 소농은 150두 이상 300두 미만,
빈농은 150두 미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구분은 토지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는 농민층
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 말하자면 소농층이 자급자족할 만한 기준소득을
대략 200두 내외(150두 이상 300두 미만)로 보는 데서이다. 그것은 그 같은 소득이 기주(시주)
의 평균가족수를 넉넉하게 잡아 3인 정도로 보고(그런데 조선후기의 호적상 1戶의 口數는 숙종
조에는 평균 1호당 4.4인, 영조조에는 4.6이며, 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4인호로서 전체의
23%이며, 다음은 3인호와 2인호로서 각각 전체의 20% 내지 15%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전호수
의 6할 내외가 4인 미만의 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의 평균구수와 기주의 평균구수
를 대비하면, 후자가 훨씬 그 수에서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아마도 기주의 평균구수를 3
인 정도로 잡으면 오히려 많은 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가족으로서 구성된 기주
호가 있었겠지만, 호적상의 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6~7할)는 1~3인 정도였을 것
이 예상된다. 그리고 특히 1인호는 분호별산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호적상의 호에서보다도 양안
상의 기주에서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인의 1년 식량을 피곡 70두 정도로 볼 때의, 기
주 1호의 1년 糧道가 될 수 있는 양곡이 되기 때문이다(소농하층). 그리고 이같은 양곡을 확보할
수 없는 농가들은 빈농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150두 미만의 빈농층이라 하더라도 1인호일
경우에는 양도가 족할 것이며, 그 소득이 150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족수가 5, 6인이나 되면
양도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경우에 있는 기주를 가려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단지
평균구수와 평균소득으로서 대체적인 경향을 추정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안상 기주의 소득에 관한 이러한 파악이, 농민 일반의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양안에는 그곳 면민만이 그곳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근대 초기 오산 농민들의 토지 소유와 경작 실태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