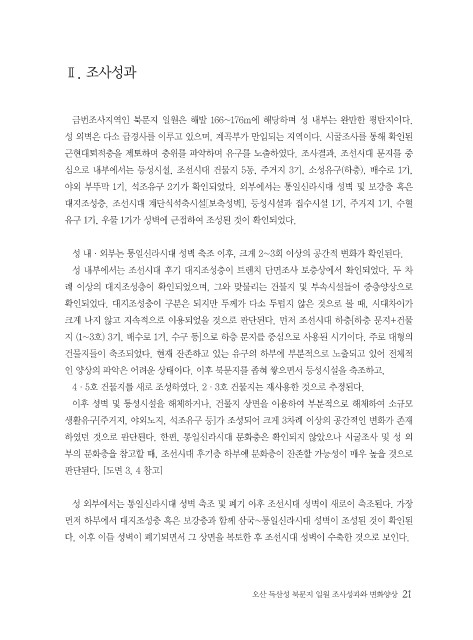Page 23 - 오산문화총서 7집
P. 23
Ⅱ. 조사성과
금번조사지역인 북문지 일원은 해발 166~176m에 해당하며 성 내부는 완만한 평탄지이다.
성 외벽은 다소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계곡부가 만입되는 지역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근현대퇴적층을 제토하며 층위를 파악하며 유구를 노출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문지를 중
심으로 내부에서는 등성시설, 조선시대 건물지 5동, 주거지 3기, 소성유구(하층), 배수로 1기,
야외 부뚜막 1기, 석조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외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성벽 및 보강층 혹은
대지조성층, 조선시대 계단식석축시설[보축성벽], 등성시설과 집수시설 1기, 주거지 1기, 수혈
유구 1기, 우물 1기가 성벽에 근접하여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성 내·외부는 통일신라시대 성벽 축조 이후, 크게 2~3회 이상의 공간적 변화가 확인된다.
성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대지조성층이 트렌치 단면조사 토층상에서 확인되었다. 두 차
례 이상의 대지조성층이 확인되었으며, 그와 맞물리는 건물지 및 부속시설들이 중층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대지조성층이 구분은 되지만 두께가 다소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대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조선시대 하층[하층 문지+건물
지 (1~3호) 3기, 배수로 1기, 수구 등]으로 하층 문지를 중심으로 사용된 시기이다. 주로 대형의
건물지들이 축조되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유구의 하부에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전체적
인 양상의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이후 북문지를 좁혀 쌓으면서 등성시설을 축조하고,
4·5호 건물지를 새로 조성하였다. 2·3호 건물지는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성벽 및 등성시설을 해체하거나, 건물지 상면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소규모
생활유구[주거지, 야외노지, 석조유구 등]가 조성되어 크게 3차례 이상의 공간적인 변화가 존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굴조사 및 성 외
부의 문화층을 참고할 때, 조선시대 후기층 하부에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 4 참고]
성 외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성벽 축조 및 폐기 이후 조선시대 성벽이 새로이 축조된다. 가장
먼저 하부에서 대지조성층 혹은 보강층과 함께 삼국~통일신라시대 성벽이 조성된 것이 확인된
다. 이후 이들 성벽이 폐기되면서 그 상면을 복토한 후 조선시대 성벽이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 독산성 북문지 일원 조사성과와 변화양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