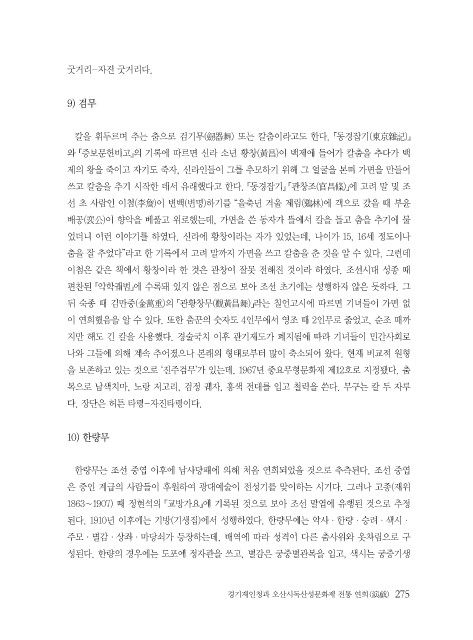Page 277 - 오산학 연구 2집
P. 277
굿거리-자진 굿거리다.
9) 검무
칼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검기무(劒器舞) 또는 칼춤이라고도 한다. 『동경잡기(東京雜記)』
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소년 황창(黃昌)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
제의 왕을 죽이고 자기도 죽자, 신라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얼굴을 본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동경잡기』 「관창조(官昌條)」에 고려 말 및 조
선 초 사람인 이첨(李詹)이 변백(변명)하기를 “을축년 겨울 계림(鷄林)에 객으로 갔을 때 부윤
배공(裵公)이 향악을 베풀고 위로했는데, 가면을 쓴 동자가 뜰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기에 물
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신라에 황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15, 16세 정도이나
춤을 잘 추었다”라고 한 기록에서 고려 말까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첨은 같은 책에서 황창이라 한 것은 관창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성종 때
편찬된 『악학궤범』에 수록돼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성행하지 않은 듯하다. 그
뒤 숙종 때 김만중(金萬重)의 「관황창무(觀黃昌舞)」라는 칠언고시에 따르면 기녀들이 가면 없
이 연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춤꾼의 숫자도 4인무에서 영조 때 2인무로 줄었고, 순조 때까
지만 해도 긴 칼을 사용했다. 경술국치 이후 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녀들이 민간사회로
나와 그들에 의해 계속 추어졌으나 본래의 형태로부터 많이 축소되어 왔다. 현재 비교적 원형
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주검무’가 있는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다. 춤
복으로 남색치마, 노랑 저고리, 검정 궤자, 홍색 전대를 입고 철릭을 쓴다. 무구는 칼 두 자루
다. 장단은 허튼 타령-자진타령이다.
10) 한량무
한량무는 조선 중엽 이후에 남사당패에 의해 처음 연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중엽
은 중인 계급의 사람들이 후원하여 광대예술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다. 그러나 고종(재위
1863∼1907) 때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말엽에 유행된 것으로 추정
된다. 1910년 이후에는 기방(기생집)에서 성행하였다. 한량무에는 악사·한량·승려·색시·
주모·별감·상좌·마당쇠가 등장하는데, 배역에 따라 성격이 다른 춤사위와 옷차림으로 구
성된다. 한량의 경우에는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별감은 궁중별관복을 입고, 색시는 궁중기생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演戲)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