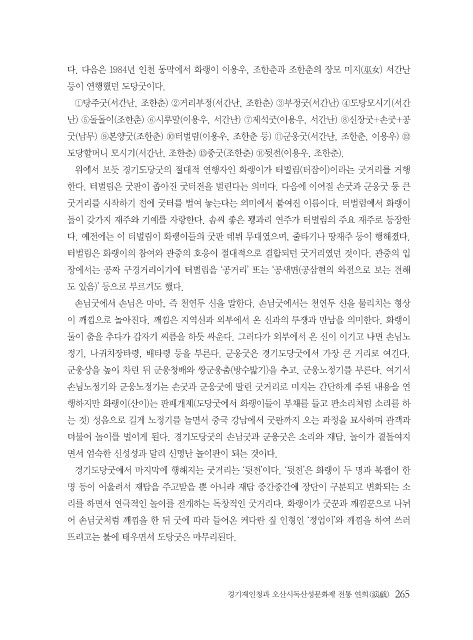Page 267 - 오산학 연구 2집
P. 267
다. 다음은 1984년 인천 동막에서 화랭이 이용우, 조한춘과 조한춘의 장모 미지(巫女) 서간난
등이 연행했던 도당굿이다.
①당주굿(서간난, 조한춘) ②거리부정(서간난, 조한춘) ③부정굿(서간난) ④도당모시기(서간
난) ⑤돌돌이(조한춘) ⑥시루말(이용우, 서간난) ⑦제석굿(이용우, 서간난) ⑧신장굿+손굿+공
굿(남무) ⑨본양굿(조한춘) ⑩터벌림(이용우, 조한춘 등) ⑪군웅굿(서간난, 조한춘, 이용우) ⑫
도당할머니 모시기(서간난, 조한춘) ⑬중굿(조한춘) ⑭뒷전(이용우, 조한춘).
위에서 보듯 경기도당굿의 절대적 연행자인 화랭이가 터벌림(터잡이)이라는 굿거리를 거행
한다. 터벌림은 굿판이 좁아진 굿터전을 벌린다는 의미다. 다음에 이어질 손굿과 군웅굿 등 큰
굿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굿터를 벌여 놓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벌림에서 화랭이
들이 갖가지 재주와 기예를 자랑한다. 솜씨 좋은 꽹과리 연주가 터벌림의 주요 재주로 등장한
다. 예전에는 이 터벌림이 화랭이들의 굿판 데뷔 무대였으며, 줄타기나 땅재주 등이 행해졌다.
터벌림은 화랭이의 참여와 관중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결합되던 굿거리였던 것이다. 관중의 입
장에서는 공짜 구경거리이기에 터벌림을 ‘공거리’ 또는 ‘공새면(공삼현의 와전으로 보는 견해
도 있음)’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손님굿에서 손님은 마마, 즉 천연두 신을 말한다. 손님굿에서는 천연두 신을 물리치는 형상
이 깨낌으로 놀아진다. 깨낌은 지역신과 외부에서 온 신과의 투쟁과 만남을 의미한다. 화랭이
둘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듯 싸운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온 신이 이기고 나면 손님노
정기, 나귀치장타령, 배타령 등을 부른다. 군웅굿은 경기도당굿에서 가장 큰 거리로 여긴다.
군웅상을 높이 차린 뒤 군웅청배와 쌍군웅춤(방수밟기)을 추고, 군웅노정기를 부른다. 여기서
손님노정기와 군웅노정기는 손굿과 군웅굿에 딸린 굿거리로 미지는 간단하게 주된 내용을 연
행하지만 화랭이(산이)는 판패개제(도당굿에서 화랭이들이 부채를 들고 판소리처럼 소리를 하
는 것) 성음으로 길게 노정기를 놀면서 중국 강남에서 굿판까지 오는 과정을 묘사하며 관객과
더불어 놀이를 벌이게 된다. 경기도당굿의 손님굿과 군웅굿은 소리와 재담, 놀이가 곁들여지
면서 엄숙한 신성성과 달리 신명난 놀이판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당굿에서 마지막에 행해지는 굿거리는 ‘뒷전’이다. ‘뒷전’은 화랭이 두 명과 북잽이 한
명 등이 어울려서 재담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재담 중간중간에 장단이 구분되고 변화되는 소
리를 하면서 연극적인 놀이를 전개하는 독창적인 굿거리다. 화랭이가 굿꾼과 깨낌꾼으로 나뉘
어 손님굿처럼 깨낌을 한 뒤 굿에 따라 들어온 커다란 짚 인형인 ‘정업이’와 깨낌을 하여 쓰러
뜨리고는 불에 태우면서 도당굿은 마무리된다.
경기재인청과 오산시독산성문화제 전통 연희(演戲)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