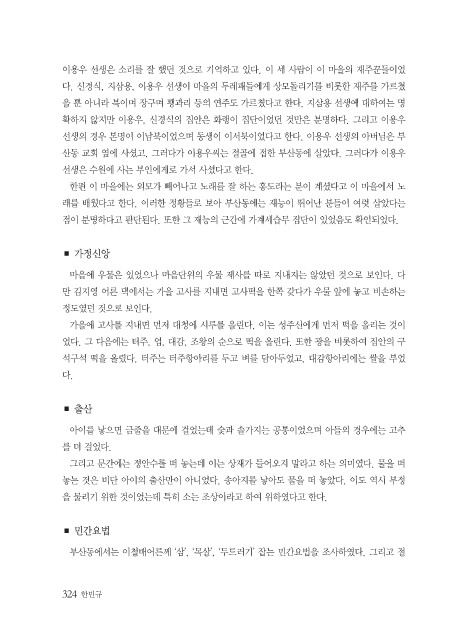Page 326 - 오산학 연구 2집
P. 326
이용우 선생은 소리를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이 이 마을의 재주꾼들이었
다. 신경식, 지삼용, 이용우 선생이 마을의 두레패들에게 상모돌리기를 비롯한 재주를 가르쳤
을 뿐 아니라 북이며 장구며 꽹과리 등의 연주도 가르쳤다고 한다. 지삼용 선생에 대하여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이용우, 신경식의 집안은 화랭이 집단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용우
선생의 경우 본명이 이남북이었으며 동생이 이서북이었다고 한다. 이용우 선생의 아버님은 부
산동 교회 옆에 사셨고, 그러다가 이용우씨는 절골에 접한 부산동에 살았다. 그러다가 이용우
선생은 수원에 사는 부인에게로 가서 사셨다고 한다.
한편 이 마을에는 외모가 빼어나고 노래를 잘 하는 홍도라는 분이 계셨다고 이 마을에서 노
래를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부산동에는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여럿 살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재능의 근간에 가계세습무 집단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 가정신앙
마을에 우물은 있었으나 마을단위의 우물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김지영 어른 댁에서는 가을 고사를 지내면 고사떡을 한쪽 갖다가 우물 앞에 놓고 비손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먼저 대청에 시루를 올린다. 이는 성주신에게 먼저 떡을 올리는 것이
었다. 그 다음에는 터주, 업, 대감, 조왕의 순으로 떡을 올린다. 또한 광을 비롯하여 집안의 구
석구석 떡을 올렸다. 터주는 터주항아리를 두고 벼를 담아두었고, 대감항아리에는 쌀을 부었
다.
■ 출산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대문에 걸었는데 숯과 솔가지는 공통이었으며 아들의 경우에는 고추
를 더 걸었다.
그리고 문간에는 정안수를 떠 놓는데 이는 상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의미였다. 물을 떠
놓는 것은 비단 아이의 출산만이 아니었다. 송아지를 낳아도 물을 떠 놓았다. 이도 역시 부정
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소는 조상이라고 하여 위하였다고 한다.
■ 민간요법
부산동에서는 이철배어른께 ‘삼’, ‘목살’, ‘두드러기’ 잡는 민간요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절
324 한민규